
‘아직 잠 깨지 않은 바다였다. 거친 바다 위 세 척의 배는 가랑잎처럼 떠돌았다.’
130여 년 전, 왕명을 받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된 이규원은 울릉도로 향하던 배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전 울릉도는 수백 년 동안 비워진 섬이었다. 고려 때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탓에 조선 태종 때부터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키고 섬을 비우는 쇄환정책(刷還政策)을 펴왔던 터였다.
1882년 고종은 울릉도를 계속 비워둬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규원을 현지로 보내 섬의 상황을 낱낱이 보고하도록 했다. 그는 10여 일 동안 울릉도 전역과 해안을 검찰한 뒤 보고서와 지도를 작성해 올렸다. 이를 바탕으로 고종이 이듬해 16가구 54명을 섬으로 이주시키며 울릉도 재개척의 역사가 시작됐다.
당시 이규원이 남긴 보고서가 ‘울릉도 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다. 이규원은 고종에게 하직인사를 한 뒤 출발해 울릉도를 조사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2개월의 여정을 일기에 담았다. 특히 12일간의 울릉도 조사 기록엔 매일의 날씨와 지형, 식생, 만난 사람들, 느낀 점 등을 상세히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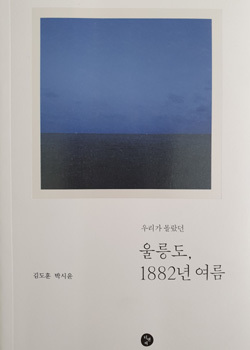
신간 ‘우리가 몰랐던 울릉도, 1882년 여름’은 검찰일기를 바탕으로 써내려간 울릉도·독도 이야기다. 울릉도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는지, 조선 정부는 왜 울릉도를 비워두고 관리했는지,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면 독도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었는지, 다시 사람이 살게 된 것은 언제 부터였는지 등 상당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쳤을 우리 역사를 쉽게 풀어 알려준다.
현직 신문기자와 작가가 함께 작업한 결과물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책을 기획하고 해설 부분과 부록을 쓴 김도훈은 매일신문 기자다. 그는 이 책을 완성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특히 이규원 일행의 울릉도 검찰 모습을 복원하는 일이 그랬다. 이규원 일행의 여정을 생생하고도 치밀하게 묘사하고 싶었지만 그건 능력 밖의 일이란 걸 실감했다”고 했다. 역사적 사실을 담보할 수 있는 사료는 검찰일기가 거의 유일했고, 기록과 기록 사이의 빈 공간을 역사적 상상력으로 채우는 일이 녹록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을 덧댄 이야기에 해설이 따르는 식’이란 당초 기획을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해당 부분을 박시윤 작가가 맡아 쓰게 된 이유다.
이 책은 ‘역사의 대중화’에 방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박 작가가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소설을 통해 130여 년 전 이규원 검찰사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리면 김 기자는 해설을 통해 그들의 여정을 소개하고 그동안 제대로 몰랐던 울릉도·독도와 관련한 대한민국 근대사를 쉽게 풀어 설명했다. 독자들이 역사의 흔적을 직접 찾아가볼 수 있도록 장소에 대한 안내도 빼놓지 않았다. 상상력을 동원했지만 기록에 없는 이야기는 피했고 객관적 사실을 따랐다. 그러면서도 독자가 읽기 편하도록 애썼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독특한 시선으로 울릉도 곳곳을 담아낸 100여 컷 사진은 책 읽는 재미를 더한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무단횡단’ 합법화한 뉴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4/128/20241114520686.jpg
)
![[기자가만난세상] 개작두와 개딸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4/128/20241114516965.jpg
)
![[세계와우리] 한국, 거센 삼각파도 앞에 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4/128/20241114520662.jpg
)
![[우리땅,우리생물] 머스크향을 좋아하세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4/128/2024111451985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