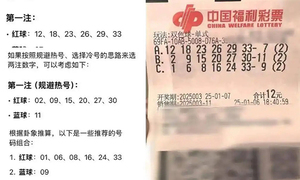고구려인들이 만들어낸 두장
인근 동북아시아 국가에 전파
왕실 폐백용품으로 쓰이는 등
예부터 귀한 음식으로 여겨져
장이 곧 우리의 정체성
콩 재배부터 메주·숙성·발효
독특한 제조법 日·中과 차이
2024년 문화적 기능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신성한 공간, 장독대
지역마다 보관장소·이름 달라
代 이은 씨간장 보관 용도 넘어
주부들의 가족 건강 염원 담겨
장독굿하는 등 ‘성역’ 여기기도

“되는 집안은 장맛도 달다”, “장이 단 집에 복이 많다”, “한 고을의 정치는 술맛으로 알고 한 집안의 일은 장맛으로 안다”, “장 맛 보고 딸 준다”, “장맛이 변하면 집안에 흉한 일이 생긴다”,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장맛도 좋아진다”….
‘장(醬)’과 관련한 말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된장과 간장 같은 장은 오랜 기간 한국인의 입맛을 책임진 음식 문화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체로 음식 맛이 장맛에 영향을 받는 동북아 3국을 대두문화권, 두장(豆醬)문화권, 장문화권 등으로 부른다.

한국의 ‘장 담그기’는 콩 재배, 메주 만들기, 장 만들기, 숙성과 발효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중국, 일본과 구별되는 독특한 제조법이다. 특히 메주를 띄운 뒤 된장과 간장을 만들고, 한 해 전에 사용하고 남은 씨간장에 새로운 장을 더하는 겹장은 독창적인 방식이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장 담그기가 세계인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유산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은 공교롭게 같은 날 터진 12·3 비상계엄 뉴스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못했다.
◆고구려의 두장, 동북아시아 전파
중국에서 장은 육장이나 어장으로 새고기나 물고기 등을 말려 가루를 낸 뒤 발효시킨 것이었다. 우리 조상이 만들어낸 두장이 전해진 후로는 두장이 일반화했다. 두장은 일본에도 6세기에 보급됐다. 두장의 기원은 콩의 원산지가 만주지역이라는 점, 고구려인이 발효식품을 잘 만들었으며 ‘시(?)’가 발해산이란 기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3세기 진(晋) 장화(張華)의 ‘박물지(博物志)’는 “외국에 시가 있다”며 “시의 냄새를 고려취(高麗臭, 고려=고구려)”라고 적어, 시가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서 건너온 것임을 알리고 있다. 시는 발해 특산물 중 하나였다. ‘해동역사’는 ‘신당서(新唐書)’를 인용해 발해의 명산물로 수도 책성의 시를 들고 있다.
콩으로 만든 시는 장과 함께 처음부터 있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오랫동안 메주로 해석이 됐지만 메주의 한자 표기는 말장(末醬)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시는 현재 중국에서는 변형된 ‘두시’로 전해지며 한국에서는 청국장(전국장), 일본에서는 낫또 형태로 생식한다.
일본식 된장국 ‘미소(末醬)’에 대해 일본 학자 아라이 하쿠세키(1657∼1725)는 “고려의 장인 말장(末醬)이 일본에 와서 그 나라 방언 그대로 ‘미소’라 부르고 고려장이라 적는다”고 남겨 한국에서 장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장과 관련한 국내 기록은 1145년에 편찬한 역사서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한다. 신문왕(재위 681∼692)대의 기록에는 683년에 왕비를 맞이하면서 보내는 납채(納采·신랑집에서 신붓집에 혼인을 구하는 의례) 품목에 ‘장’과 ‘시’가 포함돼 있다. 왕실의 폐백 물품 중 하나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당시 장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다.
‘고려사’에는 현종(재위 1009∼1031)대인 1018년 추위와 굶주림에 처한 백성에게 소금과 장을 나눠줬다는 기록이 보인다. 조선시대 역시 왕실에서 장을 보관하는 창고인 장고를 두고 ‘장고마마’라 불리는 상궁이 직접 장을 담그고 관리할 만큼 장을 귀하게 여겼다.

◆한국 문화 정체성
지역이나 장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랐으나 보통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을 전후해 메주를 만들었고, 정월∼3월 무렵에 장을 담가 음식에 썼다. 한국의 장은 한 집안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음식이다. 집마다 독특한 맛을 내는 장은 그 자체로 별미이자 최고의 조미료였다. 각 가정에서는 재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장을 만들고 발효시키기까지의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부지런한 주부들은 장 담그는 날을 따로 잡고 고사를 지냈다. 그날 왼새끼(왼쪽으로 꼰 새끼)에 숯, 한지 쪽, 붉은 고추를 꽂아서 장독 주둥이에 감아 두었다. 불이 붙은 숯을 장독 안에 집어넣고, 붉은 고추와 대추도 함께 넣었다. 버선본(버선 만들 때 이용하는 종이 본)을 장독의 배 부근에 거꾸로 붙여두기도 했다. 왼새끼와 흰색의 한지는 장을 신성하게 여겨 다른 것들과 구분하는 의미이고, 붉은 것은 부정을 물리치는 힘, 숯은 정화력을 상징한다. 버선본은 장독 주둥이로 들어가는 불순한 요소와 부정을 발로 짓밟아버리겠다는 강력한 주술적 의미를 담았다.
정혜경 호서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장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정의한다. 콩을 삶은 뒤 으깨어 일정한 크기로 뭉쳐 메주를 만들고,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적당한 온도에서 발효하고 건조하는 데만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이후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숙성시킨 뒤 액체를 달여 간장을 만들고, 건더기를 다시 발효해 된장을 완성하기까지 과정을 생각하면 실로 오랜 시간 정성 들인 음식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365일 돌봄과 애정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장”이라며 “한국인의 장 담그기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소중한 유산이자, 문화적 생명력과 창의성을 유지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장독대, 신성한 성역
대대로 이어져 온 씨간장을 고이 보관하는 장독대에 대한 인식은 더욱 각별했다. 정초에 지신밟기를 하면서 축원 의미로 장독굿을 한 게 대표적 사례다. 장독대는 정안수를 떠놓고 비는 신성한 곳이기도 했다.
장독대는 된장과 간장, 고추장 등 장류가 담긴 독과 항아리를 놓아두는 낮은 축대를 말하는데, 중부지방에서는 ‘장독대’, 북한에서는 ‘장독걸이’, 경상도를 비롯한 남부지역에서는 ‘장독간’, 제주도에서는 ‘장항굽’이라 불렀다. 한편 호남지방의 상류층에서는 ‘장광’이라 하여 장독대 주위에 담을 두르고 문까지 달아 특별하게 다뤘다. 경상도에서는 장독대를 안마당 복판에 두는 경우가 많았고, 겨울에 눈이 사람 키만큼 쌓이는 울릉도에선 장독을 아예 부엌 안에 들여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독대가 놓인 자리로는 한적하고 햇볕이 잘 드는 뒤란(뒤안)을 꼽는다.

장독의 용량은 10동이(200ℓ), 8동이, 6동이, 4동이, 2동이, 1동이 크기로 표준화 되어 있었다. 물동이는 대체로 1동이가, 술사발은 200㏄가 기준이었다. 장독 모양을 보면 중부 이북의 것은 주둥이가 넓은 편이고 복부가 밋밋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더운 남쪽 지방의 것은 주둥이가 좁고 복부가 넓다. 이런 차이는 장을 담가 숙성시키거나 저장 중에 일조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남쪽은 일조량이 많아 독의 주둥이가 넓을 경우 장이 졸아들 수 있었다.
장에 대한 주부들의 정성과 염원은 장독대를 집안의 성역으로 여기고 장과 장독을 관장하는 신을 받들어 모시는 신앙을 형성했다. 호남지역의 ‘철륭’ 또는 ‘철륭할마이’와 중부·남부의 ‘칠성’이 그들이다. 영남 지역에선 ‘이월 할매’가 장독대에 내려와 머물다 가는 것으로 믿었다. 이 같은 신앙은 주부들이 담당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보전에 관한 열망으로 이해된다.
음식은 인격·권력·역사의 덩어리이며 가족은 음식을 함께 먹는 문화공동체이므로 장맛은 곧 집의 정체성이자 가풍으로 여겨졌다. 또한 장은 음식 중 저장성이 매우 뛰어나, 1년간 먹을 양을 한꺼번에 만들어 보관하는 부식이었다. 부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식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는가는 곧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이의 삶을 임하는 태도로 인식됐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장 담그는 비결을 전수받을 때 가풍이 이어지고 가문이 흥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장 맛이 좋아야 많이 먹을 수 있으며, 많이 먹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집이 흥한다는 논리를 낳았다.
장 담그기는 품앗이로 이뤄지는 김장과 달리 대문을 걸어 잠그고 창호지로 입을 봉한 채 진행했다. 비개방적이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다원성을 지닌 문화를 창조했다. 집집마다 독특한 맛의 ‘씨간장’을 대대로 남겨주는 가양문화(家釀文化)를 탄생시켰다.
‘아기를 가졌을 때 담은 간장으로 그 아이가 결혼할 때 국수를 말면 잘 산다’는 속담처럼 변치 않게 관리한 장으로 잔칫날 국수를 말아 손님대접을 할 정도이니 장에 기울이는 정성은 가히 하늘에 닿을 만하다.
“장은 모든 맛의 으뜸이요, 장맛이 좋지 않으면 좋은 채소나 맛있는 고기가 있어도 좋은 요리가 될 수 없다.”(증보산림경제)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사우디 왕세자 ‘Mb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500.jpg
)
![[기자가만난세상] 600살 대왕소나무의 죽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395.jpg
)
![[세계와우리] ‘전략적 황금기’ 北… 韓의 준비태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63.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韓 쇼트트랙의 아픔, 린샤오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632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