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대병원 신경계 중환자실로 30대 초반의 여성이 실려 들어왔다. 타병원 입원 중 경련이 지속돼 항경련제 투약과 정맥 내 마취제를 투약하고 인공호흡기를 했지만 차도가 없어 옮겨진 환자였다. 뇌전증 지속 상태로 인한 사망률은 5~50%. 편차가 상당하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경련 시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예후는 좋지 않다. 환자는 경련이 열흘 넘게 지속되고 의식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전원 후 바로 뇌파 감시를 시작하고 항경련제를 조절했다. 정맥 마취제는 줄이고 다른 항경련제를 조정하면서 일주일이 지나 변화가 나타났다. 정맥 마취제 투약을 모두 중단할 수 있었고, 뇌파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후 항경련제도 줄였고, 전원된 지 열흘쯤 지나 환자가 마침내 눈을 떴다. 의식이 돌아오면서 뇌파 감시를 종료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환자가 처음으로 입을 뗐다. 이미 한 달여 가까운 기간 말을 하지 못했던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가 천천히 내뱉은 말은, “선생님, 감사합니다”였다.

이제 갓 30세 넘은 나이의 환자에 대한 안쓰러움과 발을 동동 구르는 보호자, 엄마가 심각한 상황인지도 모르는 어린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필자 역시 환자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다. 그 바람이 이뤄진 데 대한 안도감인지,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감사함을 표한 환자에 대한 특별한 고마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다.
환자는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겼고, 약간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거동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해 무사히 퇴원했다. 보호자와 환자의 얼굴에도 미소가 스쳤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은 말 그대로 ‘중한’ 환자들, 즉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다. 심정지, 혈압, 산소포화도와 같은 혈역학 징후 이상이나 패혈증, 의식 저하, 경련 등 환자가 입원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집중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럴 때마다 의료진과 보호자의 마음은 함께 출렁인다.
태어난 순서는 정해져도 떠나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들 하지 않는가.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환자도 마찬가지다. 어린아이부터 꽃다운 청춘의 청년,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예측하지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은 위기를 맞는다.
2024년 기준 국내 중환자실 사망률은 약 11%로 보고됐다. 신경계 질환을 다루는 신경계 중환자실의 경우 일반 중환자실 사망률보다 낮은 5~7% 정도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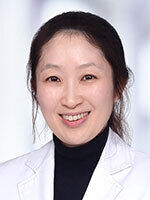
필자는 신경과 전문의이자, 뇌졸중과 신경중환자 전임의를 수련한 이후 신경계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다. 필수·중증·응급 질환이 총집합된 공간에 몸 담은 셈이다.
환자의 회복을 위해 치열하고 급박하게 진료하는 곳에서 일하는 만큼 하루 종일 환자 옆을 지켜야 하거나 주말에도 병원에 출근하는 일이 잦다.
요즘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두고 세상이 시끌벅적하다. 내게 “왜 힘든 일을 자처하냐”, “대단하다”라고 하는 소리도 자주 듣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은 ‘희망’을 꿈꾸는 장소라고 말하고 싶다. 생사의 기로에서 의식을 회복해 퇴원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환자를 바라보는 것, 의료진에게 그 이상의 보람은 없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조선통신사선(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4/128/20250424524776.jpg
)
![[기자가만난세상] 시골 어르신들, 왜 쓰레기를 태울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6/18/128/20210618512915.jpg
)
![[삶과문화] 5분이면 족한 것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36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