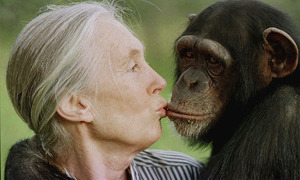추석 명절을 앞두고 쌀값이 단기간에 8% 이상 치솟으며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시장 격리 정책과 병해충 피해가 맞물려 올해 재고 물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외식업계, 급식업체 등까지 전방위 타격을 받고 있다.
단순한 계절적 상승이 아닌 쌀 유통 구조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달 만에 8%↑…“27% 폭등”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쌀 20kg 소매가는 6만5028원으로, 전년 동기(5만967원) 대비 27.6%나 올랐다.
지난달 초 6만원 수준에서 출발한 쌀값은 10일 만에 6만1000원을 넘어섰다. 불과 2주 만에 6만5000원을 돌파했다.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시장 격리 조치가 꼽힌다.
당시 정부는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12만t 초과할 것으로 보고, 수확기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26만2000t을 강제로 격리했다.
실제 생산량은 병충해 탓에 예상보다 적은 358만5000t에 그쳤다. 이로 인해 올해 유통 단계부터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공깃밥 2000원 시대…외식업계 “생존 조정”
쌀값 급등은 자영업 현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서울의 한 고깃집은 공깃밥 한 그릇 가격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다.
배달앱에서도 2000원 공깃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식당은 공깃밥을 아예 없애고, 대신 솥밥이나 볶음밥 같은 부가가치 높은 메뉴로 대체하고 있다.
일부 업소는 값이 더 오를 것을 우려해 미리 쌀을 사재기하기도 한다. 떡집은 원재료 대체가 어려워 재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쌀 대신 다른 곡물을 섞기 어려워 원재료가 조금만 달라져도 제품 특성이 변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쌀 소비량이 많은 전통주 업계는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이 막히면서 소규모 막걸리 양조장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돈이 없어서가 아닌 쌀이 없어 발효와 증류를 멈추는 상황”이라고 알리며 업계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전통주는 특정 품질 이상의 쌀이 필요해 대체가 불가능하다.
소비자 가격 저항이 큰 탓에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렵다. 영세 양조장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급식·즉석밥 업계도 ‘긴장’
급식업체와 식자재 유통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쌀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지만, 대부분 산지와 계약재배를 맺고 있어 당장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즉석밥 제조업체 역시 비슷한 사정이다. 다만 올해 계약 물량이 소진된 이후에는 부담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이달 말 본격 출하되는 중·만생종 햅쌀 수급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는 조생종 햅쌀 품귀 현상으로 비용이 작년 대비 20%가량 상승한 상태다.
◆전문가들 “정부 개입→시장 왜곡…구조적 개편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쌀값 급등이 단순히 계절적 현상이 아닌 농정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시장 격리는 단기 가격 하락을 막았지만, 올해 공급 불균형을 키웠다. 병해충 피해까지 겹치며 재고 부족이 심화됐다”며 “쌀은 외식업계의 핵심 원재료라 원가 10% 상승만으로도 수익 구조가 흔들린다. 자영업자들의 메뉴 조정은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주는 원재료 대체가 불가능하고, 가격 저항도 커서 소규모 업체의 생산 중단이 속출할 수 있다”며 “조생종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중·만생종 수확이 본격화되면 일시적 불균형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가격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격리 정책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후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 실패는 오히려 시장 왜곡을 키운다”며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수급 ‘불균형’…해법은?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급등·급락 사태가 근본적으로 농업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수요 기반 계약재배 확대 △쌀 외 소비처 다변화 △유통 효율성 제고 등 구조적 개편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를 압박하는 쌀값 불안정. 이번 사태는 단순한 농산물 가격 문제가 아닌 한국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주한 美 7공군 사령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817.jpg
)
![[기자가만난세상] 슬기로운 명절 에티켓](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599.jpg
)
![[세계와우리] 경주 에이펙과 실용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808.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달을 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5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