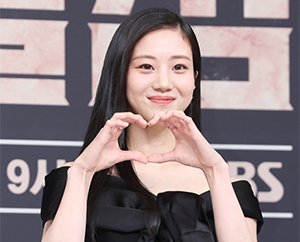구중궁궐에 어둠이 내렸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호머 헐버트 박사는 잠이 오지 않았다. “폐하! 주무시고 계십니까?” 바로 옆방에서 고종도 뒤척이고 있었다. 다시 잠을 청하기는 글렀다. 두 사람은 얘기꽃으로 밤을 새웠다. 헐버트가 왕의 침실을 지키던 1895년 초겨울의 일이다. 명성황후 시해에 놀란 고종이 그를 비롯한 외국인에게 불침번을 부탁한 것이다.
구중궁궐에 어둠이 내렸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호머 헐버트 박사는 잠이 오지 않았다. “폐하! 주무시고 계십니까?” 바로 옆방에서 고종도 뒤척이고 있었다. 다시 잠을 청하기는 글렀다. 두 사람은 얘기꽃으로 밤을 새웠다. 헐버트가 왕의 침실을 지키던 1895년 초겨울의 일이다. 명성황후 시해에 놀란 고종이 그를 비롯한 외국인에게 불침번을 부탁한 것이다.
헐버트는 조선의 안위에 생명을 걸었던 벽안의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고종의 밀서를 품에 안고 미국으로 건너가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1907년 만국평화회의 때에는 이준 열사 일행보다 먼저 헤이그에 가 한국 대표단의 호소문을 신문에 실었다. 그는 역사 속에 숨겨진 제4의 진짜 밀사였다.
한국에 대한 그의 인연은 18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식 관립학교인 육영공원 교사로 부임한 스물 셋의 청년은 백의민족의 정과 문화에 푹 빠졌다. 월간지 ‘코리아 리뷰’를 펴내 조선의 문화와 정세를 세계에 전했다. 첫 한글 교과서를 만들어 교재로 쓰기도 했다. 구전으로 전해오던 아리랑을 채보해 널리 알린 이도 헐버트였다.
일제에 의해 미국으로 쫓겨났지만 그의 한국 사랑은 식지 않았다. 꾸준한 문필 활동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했다. 그는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다. 1949년 여든 여섯의 노구를 이끌고 인천항에 내렸지만 건강 악화로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그런 후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유언에 따라 서울 양화진에 잠들었다.
어제 그의 묘지에서 조촐한 62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각계 인사들이 그의 고귀한 뜻을 마음에 새겼다. 헐버트는 조선의 국운이 기울던 1906년 뉴욕에서 ‘대한제국 멸망사’를 펴냈다. ‘영혼의 조국’이 외세 침탈의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하려는 염원에서다. 그는 저서에서 ‘당쟁으로 정치 도덕이 서글프리만큼 퇴보했고 이것이 일본의 침입을 당해 무기력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다’고 했다. 그의 말은 백년 전 모습만이 아닌 것 같다. 정쟁과 갈등으로 날을 지새우는 오늘의 세태를 꼬집는 말로 들린다.
배연국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마윈의 복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3/128/20250223510434.jpg
)
![[특파원리포트] 케네디센터 코드인사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2/128/20250112515508.jpg
)
![[김정식칼럼] 내수 살리기 총력전 펼쳐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9/128/20250119516487.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멀고 험난한 ‘유종지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2/128/202501125154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