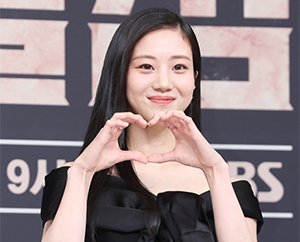SGI서울보증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공개(IPO)를 위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다. 앞서 2023년 10월 IPO를 철회한 뒤 두 번째 도전이다.
이명순 서울보증 사장은 당시 IR에서 “서울보증은 상장을 통해 국내 유일의 종합보증보험사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대표 배당주로서 시장 투자자들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은 2023년 IPO 도전 당시 수요예측 부진을 이유로 자진 철회했던 탓에 이번에는 기존보다 희망 공모가 밴드를 대폭 낮춰 재도전에 나섰다. 상장 후에는 모회사 격인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7년까지 최대 33.85%를 매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사장의 말처럼 서울보증은 국내 유일의 전업보증보험사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부실했던 두 보증보험사의 합병 후 당시 예보가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인수한 덕분에 오늘날의 구조를 갖췄다. 예보는 여전히 5조원이 훌쩍 넘는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2021년 감사원 감사에서 “공적자금 회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예보와 서울보증 입장에서 이번 IPO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서울보증의 IPO 추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다. 먼저 이번 공모는 예보의 구주매출로만 이뤄진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다. IPO 후에도 회수가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오버행(잠재적 대량 매도 물량)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서울보증이 중금리 대출, 전세자금 대출보증, 신원보증, 각종 이행보증 등의 상품과 보증을 시장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도 이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서울보증의 독과점을 들어 “시장에서 높은 보증료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2년 말 국내 보증시장에서 점유율은 24.7%에 이르는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실제 다양한 공공기관이 보증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보증의 점유율은 사실상 독점에 가깝다. 그런데 민간 보험사들의 시장 개방 요구에 지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과점 우려로 인한 부작용은 보증료뿐만은 아니다. 보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이른바 ‘갑질’ 행태로도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다. 2018년에는 지방의 한 중소 건설사에 보험금 지급을 미뤄 논란이 되기도 했고, 보증증권 발급 조건으로 과도한 현금 담보 및 대주주 담보 등을 요구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지난 국감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한 임원에 대한 구설도 서울보증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었다.
최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심사와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주로 유의 대상이지만, 코스피 기업 역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코스피 상장사 쌍방울이 상장폐지되기도 했다.
서울보증처럼 국민과 기업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기업의 IPO는 심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민간금융의 형태를 가졌지만,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시장(KOSPI)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마윈의 복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3/128/20250223510434.jpg
)
![[특파원리포트] 케네디센터 코드인사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2/128/20250112515508.jpg
)
![[김정식칼럼] 내수 살리기 총력전 펼쳐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9/128/20250119516487.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멀고 험난한 ‘유종지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2/128/202501125154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