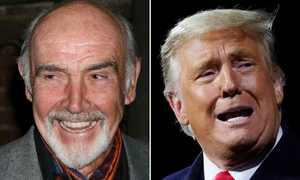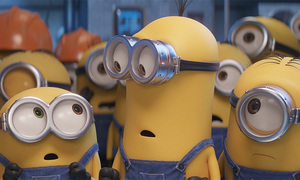1960년대 초,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남북 간 대치와 4·19혁명, 5·16 쿠데타 등 정정 불안으로 외국자본 유치는 언감생심이었다. 이웃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1년 12월 돌파구로 서독과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에 서명한다. 한국에 대한 1억5000만마르크(당시 환율로 3700만달러)의 원조를 대가로 서독은 한국인 광부 5000명과 간호사 20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노동력 수출이었다. 아무나 가기는 어려웠다. 대졸자가 넘쳤다. 1963년 파독 광부 500명 모집에 4만6000명이 몰려 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현실은 열악했다. 새벽 4시에 기상해 지하 1200m 갱도에서 35도를 넘나드는 지열과 석탄 가루를 견뎌야 했다. 간호사들도 독일인들이 꺼리는 일을 도맡았다. 2014년 개봉된 영화 ‘국제시장’에서 그 일부가 소개됐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 독일에서 광부 65명, 간호사 44명, 기능공 8명이 사망했다. 크고 작은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 와중에 차별이나 핍박이 없었을 리 없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초심을 잃거나, 힘들고 미약했던 과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흔히 하는 말이다. 최근 전남 나주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비닐에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한국인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멸시는 다반사다. 반면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건 극히 드물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이직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현행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는 현장에서 부당해고나 상해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사업장 이전을 원할 경우 반드시 사업주 동의를 구하도록 못 박고 있다. 사업주 동의가 없다면 현장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오죽하면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러한 이직 제한을 강제노동으로 분류하며 비판하겠나. 이주노동자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이들을 대하는 시선도, 제도도 바뀌어야 할 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서러운 이주노동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9/128/20250729518975.jpg
)
![[데스크의 눈] ‘갓비디아’가 된 엔비디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9/128/20250729518953.jpg
)
![[오늘의 시선] 위험한 실험 ‘집중투표 의무화’ 멈춰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9/128/20250729518938.jpg
)
![[안보윤의어느날] 생각과 다른 매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29/128/2025072951888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