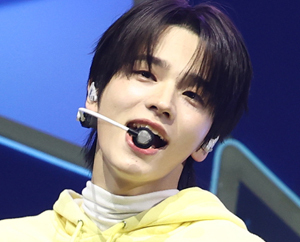2010년으로 거슬러 가 보자. 정부가 비대면(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냈지만 무산됐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혁신을 애써 외면한 의료계의 반발 탓이다. 하지만 세계적 팬데믹(대유행)이 촉매제가 됐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게 ‘비대면진료’다. 특히 농어촌 지역, 도서 벽지, 고령층 환자들에게 스마트폰 하나로 병원과 연결되는 경험은 의료의 패러다임을 뒤흔들었다.
수치로도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 코로나19 대유행 3년간 ‘한시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총 3600만건이 이뤄졌다. 약 배송도 허용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이 축소·확대를 오가면서 법적 기반 없이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게 문제다. 2023년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비대면진료는 ‘한시허용’에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6개월 이내 다녔던 병원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했고, 약 배송도 금지됐다.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 계기가 의정갈등인 것도 아이러니다. 2023년 12월부터 야간·휴일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지난해 2월부터는 모든 병·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같은 병원에서 재진이 가능하고, 섬·산간벽지·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초진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20일부로 정부가 1년8개월간의 ‘의료대란’ 공식 종료를 선언하며 비대면진료가 병원급부터 중단된다. 비대면 진료비율도 30%로 제한되고, 의원급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 이를 틈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무분별하게 확산한 비대면진료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 기준 등을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한다지만 실상은 2년 만에 원점이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6건은 모두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비대면진료 법제화로 디지털 의료 산업을 키우는 사이 우리만 제자리걸음이다. 기득권에 갇혀 낡은 규제에서 허우적대는 한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갈 길 먼 비대면진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9/128/20251019510639.jpg
)
![[특파원리포트] 일본의 노벨상 수상 방정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9/128/20251019510603.jpg
)
![[이종호칼럼] 기술강국 도약만이 살길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9/128/20251019510462.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미국 남북전쟁이 남긴 경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9/128/202510195104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