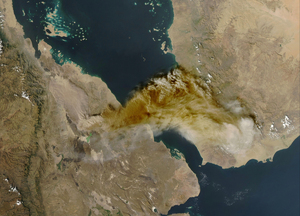최근 한국의 대표 명문대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모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수백명 이상 수강하는 비대면 수업에서 원격으로 시험을 보는 도중 인터넷·AI를 검색해 답안을 작성하고,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해 문제를 올린 뒤 답안을 공유하는 식으로 고득점을 노렸다. 심지어 대면 강의 중간고사에서 시험 전 AI 활용 금지를 안내했음에도 생성형 AI를 써 문제 풀이를 한 일부 학생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알려진 사례일 뿐 실제로는 전국 각지에서 훨씬 만연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대학가에서 줄줄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AI 부정행위 사태’는 본격화된 AI 대혁명의 시대에 여러 화두를 던진다. 이 중 상당수는 그러나 AI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의 문제이고, 오랫동안 내버려뒀던 윤리와 가치관 부재의 여파를 최첨단 기술의 등장과 함께 직격으로 맞은 것에 가깝다.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영상을 촬영하며 시험을 보라는 지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걸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AI를 쓰겠다고 결정했다. 비대면 시험의 허점을 이용해 단체대화방에서 답안을 모의하고, 버젓이 안내된 AI 금지문을 무시한 채 대면 시험장에서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받는 높은 점수, 노력 없이 얻는 성과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제껏 AI 부정행위 관련 대비를 하지 못한 대학의 안이함, 제한된 시간 안에 AI로 손쉽게 정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시대착오성을 지적한다. AI를 써도 풀지 못하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내서 대비하겠다는 현직 교수들의 방편도 들려온다. 대놓고 AI를 활용하게 하되 어떤 대화를 거쳤는지를 보는 사고 흐름을 채점한다거나 과제 제출 후 발표와 토론, 구술시험 등으로 대면 검증제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실상 막을 수 없어진 AI를 ‘학습도구’로 인정한 영미권은 AI와 함께 만든 결과물에 대한 표절 및 부정행위 기준을 새롭게 매뉴얼화하는 추세이며, 우리도 결국 이 길을 가야 한다는 분석이 대세다.
이런 현실적인 방안들의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는 한편, 지금 진짜 시급한 건 AI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라도 성과를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허용해버리는 초라한 윤리 의식이란 생각이 든다. 인권 감수성이나 평등 의식이 국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한국은 AI 윤리 측면에서도 기술이나 안보 쪽의 눈부신 성과에 비해 논의의 깊이가 부족한 인상을 준다. 이는 출발선이나 과정의 공정함에 대한 시민 의식이 기존에도 그다지 고취돼 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AI 혁명으로 더 크게 벌어질 디지털 격차에 대한 성찰, AI 활용력 자체를 능력지표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따라와야 AI 대세론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생각한다. 대학가 AI 부정행위 사태가 ‘챗GPT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평가방식 문제’로 축소되는 흐름에 선뜻 동조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래서였던 것 같다. 주객이 전도되어 주도권을 AI에 넘겨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류가 공멸하는 길이 될 수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국판 장발장’에 무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7/128/20251127519404.jpg
)
![[기자가만난세상] AI 부정행위 사태가 의미하는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7/128/20251127519346.jpg
)
![[세계와우리] 트럼프 2기 1년, 더 커진 불확실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7/128/20251127519384.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엄마에게 시간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7/128/202511275193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