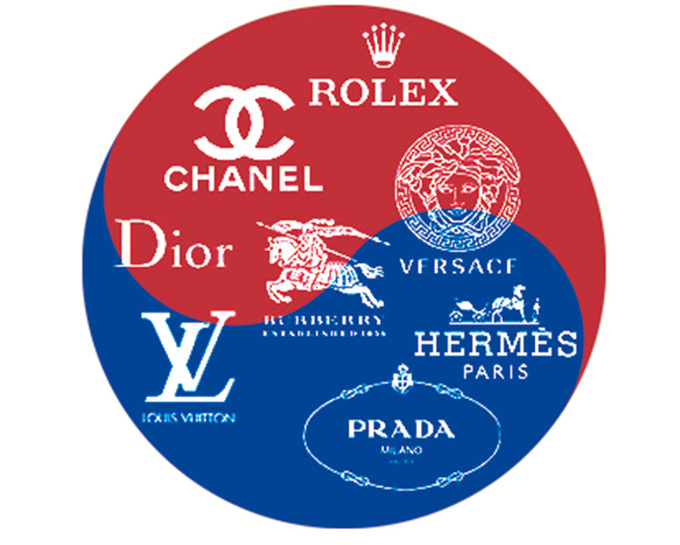
“값비싼 상품의 과시적 소비는 유한계급들이 존경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이다.” 미국 사회·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이 1899년 출간한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당시 미국의 상류계층이 먹고 놀면서 고가의 제품을 사들이는 약탈적 자본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했던 말이다. 사치품이나 명품의 경우 비쌀수록 잘 팔리고 값을 내리면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베블런 효과’라 불리는 건 이런 통찰에서 기인한다.
그의 지적처럼 명품산업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아랑곳없다. 2021년 코로나19 창궐로 세계 경제가 침체의 수렁에 빠져도 글로벌 명품시장은 2942억달러(약 380조원)로 전년 대비 13.5%나 성장했다. 지난해에도 6% 이상 늘어난 312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 따르면 프랑스 대표 기업 루이비통모에에네시(LVMH: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셀린느 등), 샤넬과 이탈리아 케링그룹(구찌, 생로랑), 미국 에스티로더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 브랜드는 가뭄에 콩 나듯 한다. 아모레퍼시픽이 유일하게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하지만 한국인의 명품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최근 모건스탠리의 명품 소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품 소비액이 1인당 324달러로 미국 280달러, 중국 55달러를 제치고 세계 1위였다. 이탈리아 매체 ‘일 솔레 24 오레’는 한국이 세계 명품시장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다고 했다. 국민 4명 중 3명이 최소 한 개 이상의 명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올 정도다.
베블런에 따르면 사치재가 비쌀수록 잘 팔리는 건 과시욕과 우월감 때문인데 모든 계층에 존재한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한국인의 명품 사랑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아마도 명문대를 향한 별난 교육열이나 명품 주택·차를 열망하는 욕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명저 ‘구별짓기(La Distinction)’에서 베블런 효과를 넘어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집단·계급별로 서로 다른 문화 소비와 취향을 해부했다. 그에 따르면 문화자본을 축적하려는 한국인의 욕구가 아주 강렬한 것인데 사회·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창의력의 보고일지도 모를 일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드론 받이’ 된 북한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9/128/20241219519153.jpg
)
![[기자가만난세상] 1000년 전 유물, 일제의 광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11/128/20220711522634.jpg
)
![[세계와우리] 시리아 반군 승리가 러에 뼈아픈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4/128/20241114520662.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농구대통령 허재는 어디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9/128/2024121951639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