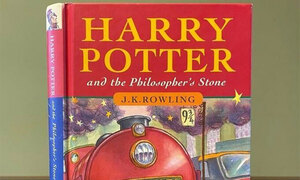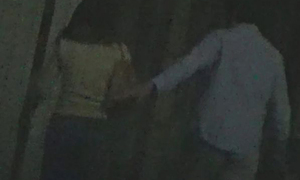플랫폼서 車·실손 등 보험상품 비교·추천
2024년 자동차부터 출범했지만 흥행 실패
다이렉트보다 비싸고 정보 기입 불편 탓
당국, 보험 가격 일원화 위한 조정 추진
보험사들 “수수료율 1% 이하로 내려야”
플랫폼 “서버 구입비 부담… 더 양보 못 해”
일각 “혁신하려다 되레 보험료만 올릴 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준비해 온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이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보험정보 구축을 위한 서버 도입 지연으로 출시 시점이 지난해 연말에서 이달 말로 연기된 가운데 수수료율을 둘러싼 대형 보험사와 플랫폼사 간 해묵은 갈등이 풀리지 않아서다. 2.0의 핵심은 비교·추천 플랫폼과 보험사 CM(다이렉트 채널)의 보험 가격 일원화인데, 일각에선 수수료율 갈등이 되레 양쪽 보험료 모두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소비자 편익과 보험사 간 경쟁 촉진을 위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가 자동차·단기·실손·저축성·펫·여행자 보험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월19일 출범한 자동차 서비스의 경우 의무보험인 데다 다른 보험보다 상품 구성이 단순해 은행권의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처럼 흥행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난 9월 말 기준 누적 서비스 이용자 81만여명 중 가입자가 10%에도 못 미치는 7만3000여명에 그쳤다. 이용자 대다수가 플랫폼에서 가격만 비교하고 보험사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흥행 실패 원인으로는 플랫폼에 제시된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채널) 보험료보다 비싼 데다 소비자가 보험계약 만기일과 각종 차량 정보를 직접 기입해야 하는 불편이 꼽힌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약 85%를 차지하는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등 4개 대형 보험사의 경우 다이렉트 채널의 자동차보험료가 플랫폼보다 낮다.
이에 금융당국은 플랫폼사들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기존 3%에서 최대 1.5%로 내려주고, 보험사들이 플랫폼사에 제공하지 않던 세부정보를 보험개발원 서버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플랫폼 수수료율을 낮춰도 다이렉트 채널 수준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맞추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한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플랫폼 수수료율을 1% 이하로 내려야 한다”며 “사실상 103만원에 팔던 보험을 100만원(다이렉트 채널 가격)에 팔라는 것이므로 보험사 입장에선 없던 비용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데다 최근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험료까지 인하한 상황에서 다이렉트 채널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리면 일부 보험사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면서 “결국 내년 보험료 산정할 때 양쪽 자동차보험료 모두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굳이 수수료를 내면서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판매할 동기가 없다”며 “비교·추천 서비스가 활성화된 후 플랫폼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시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도 걸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사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자동차 세부정보 제공을 위한 서버 구입비와 건당 정보 이용료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양보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한 플랫폼사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손보사들이 온라인 배너광고 등의 채널에 주는 10%대 중개 수수료보다 현저히 낮은 3%로 운영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그 수수료마저 플랫폼에 내놓는 보험 가격에 얹어 소비자에게 청구해왔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다른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펫보험과 해외여행자보험 등은 대형손보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와 플랫폼에 내놓는 가격이 동일한데 자동차만 다르게 운영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LED 쥐불놀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128/20250211518398.jpg
)
![[데스크의 눈] 파면 아니면 복귀, 받아들일 수 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4/06/128/20220406518006.jpg
)
![[오늘의시선] 자원 탐사는 계속되어야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128/20250211514291.jpg
)
![[안보윤의어느날] 한밤의 산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3/128/202411135001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