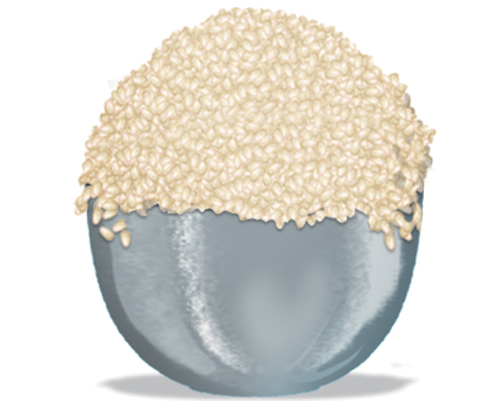
언제부터 고봉밥을 먹었을까. 조선시대 성호 이익이 남긴 글. “많이 먹기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천하의 으뜸이다. 유구국에 표류한 자가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이 비웃어 이르기를, 너희 풍속이 언제나 큰 사발과 쇠숟갈로 밥을 떠 실컷 먹으니 어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유구국은 오키나와다. 밥을 많이 먹어 욕을 먹었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익은 이런 글을 덧붙였다. “늘 굶을 수는 없지만 너무 지나친 것이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백성의 주린 배를 조금이라도 불려 보려는 고민이 묻어난다.
왜 고봉밥을 먹었을까. ‘사계의 나라’ 조선. 식량을 생산하는 때는 여름 한철뿐이다. 고봉밥에 의지해 소처럼 일을 해야 한다. 곡식 외에 무엇을 더 먹을 수 있었을까. ‘상하의 나라’ 유구국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알았을까.
부릴 소라도 많았던가. 소 잡아먹는 풍습을 신랄하게 비판한 실학자 박제가. “연경에서는 소 도살을 금한다. 황성에는 돼지 고깃간 72곳, 양 고깃간 70곳이 있지만 소 고깃간은 3곳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날마다 소 500마리가 죽어 나간다.” 경제 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소를 잡아 잔치판을 벌이는 세태가 답답했던 모양이다. 율곡 이이는 평생 쇠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박제가는 전한다. “소 힘으로 지은 곡식을 먹으면서 또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옳겠는가.”
쌀 소비량이 또 줄어들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61.9㎏. 재작년보다 1㎏ 줄었다. 하루 먹는 밥 양으로 따지면 1인당 평균 한 공기 반 정도만 먹는다고 한다. 쌀밥도 먹지 않으니 참 풍요로운 시대다. 풍요를 만들어낸 힘은 무엇일까. 고봉밥을 먹으며 소처럼 일한 우리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고봉밥이 새삼 그립다.
강호원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예측불허 콘클라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9/128/20250429520667.JPG
)
![[데스크의 눈] 대통령 집무실 이전, 최선입니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3/128/20241113500131.jpg
)
![[오늘의시선] SKT 해킹, 공포 아닌 냉정함이 필요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9/128/20250429520417.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51년 만에 돌아온 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5/128/2025041551996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