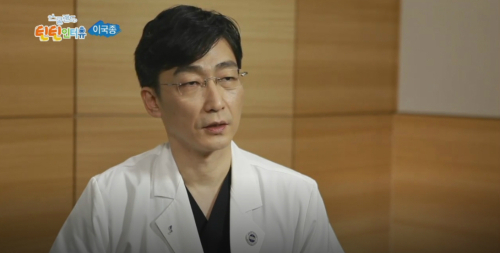
"내가 크면 아픈 사람에게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않으리라"
북한군 귀순병사를 살려낸 아주대학교 교수 이국종(사진)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 다짐했던 말이다.
이국종은 2012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사가 되기로 한 이유가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의 아버지는 6·25전쟁 때 지뢰를 밟아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2급 국가유공자였다.
이국종은 중학생 때까지 학교에 국가유공자 가족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세상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비정했고, ‘병신의 아들’이란 손가락질이 더 무서웠기 때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아버지는 약주를 하면 아들 이국종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어린 시절 이국종은에게는 6·25 참전용사란 영광보다 상처가 컸다.
이국종은 중학생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았다.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이국종은 국가유공자 가족의 의료복지카드를 내밀었다. 이를 본 간호사의 반응이 싸늘했다. 다른 병원에 가라고 짜증을 냈다고.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고, 이국종은 커다란 생채기가 난 마음으로 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카드를 보여줬음에도 의사는 정성껏 진료를 해줬다.
특히 의사는 이국종을 향해 “아버지가 자랑스럽겠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했고, 진료비도 받지 않았다.
당시 이국종은 하지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그리고 사람 가리지 않고 성심껏 치료해 주는 그 모습이 멋지단 생각은 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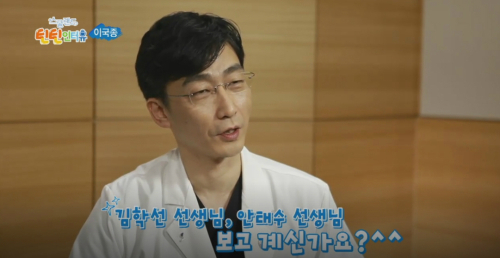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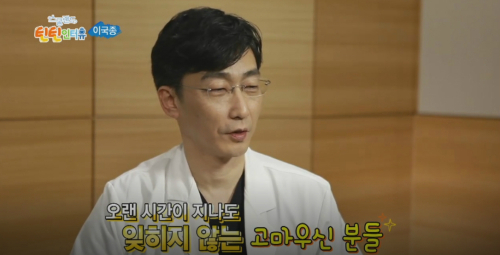
EBS '스쿨랜드-틴틴인터뷰'에서 이국종은 의사가 된 계기를 묻는 말에 어린시절 동네에서 잘 해준 의사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어 "(그분들은) 어려운 분한테 별로 돈을 받지 않았다. 그때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도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시) 의사가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를 한 명 한 명 잘 봐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로 돌아가서 (다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환자를 진료하는 그 자체가 봉사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덧붙엿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EBS '스쿨랜드-틴틴인터뷰'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예측불허 콘클라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9/128/20250429520667.JPG
)
![[데스크의 눈] 대통령 집무실 이전, 최선입니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3/128/20241113500131.jpg
)
![[오늘의시선] SKT 해킹, 공포 아닌 냉정함이 필요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9/128/20250429520417.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51년 만에 돌아온 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5/128/2025041551996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