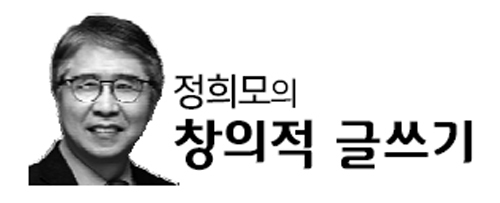
국어사전에는 부사를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로 동사나 형용사 앞에 놓여 의미를 더 뚜렷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부사에 대해 전혀 상반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유명한 추리 소설가이자 저술가인 스티븐 킹은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부사로 뒤덮여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부사는 민들레와 같아서 한 포기가 돋아나면 제법 예뻐 보이지만 곧바로 뽑아버리지 않으면 우후죽순 쏟아나 여러분의 잔디밭을 온통 잡초처럼 뒤덮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문장을 늘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점심을 먹었다’라는 표현보다 ‘나는 점심을 맛있고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쓴다. 수식어를 써서 독자에게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스티븐 킹은 이런 심리를 부사를 써주지 않으면 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봐 필자가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돌려줘, 그는 비굴하게 애원했다”에서 “돌려줘, 그는 애원했다”라고 말하면 되지 굳이 거기에 ‘비굴하게’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정말, 순, 진짜 참기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문장을 늘이는 것은 부사뿐만 아니라 관형사나 관형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대학생이다’라는 문장보다 ‘나는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다’라고 쓰기를 좋아한다. 나의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해주고자 하는 필자의 조바심이나 나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고자 하는 우월심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많은 정보는 독자의 생각을 좁게 만들고 문장의 맛을 떨어뜨린다. 독자가 추측할 수 있다면 굳이 수많은 정보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 언젠가 정민 교수의 책에서 한시 구절 ‘텅 빈 산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해 ‘빈 산 잎 지고, 비는 부슬부슬’로 22자를 11자로 만든 사연을 읽은 적이 있다. 글은 짧아졌는데 생각은 더 깊어졌다. 문장의 묘미는 바로 이런 데 있다.
독자가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을 하는 필자에게 스티븐 킹이 한 말이 있다. “여러분의 독자가 늪 속에서 허우적거린다면 마땅히 밧줄을 던져줘야 할 일이다. 그러나 쓸데없이 30미터나 되는 강철케이블을 집어던져 독자를 기절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는 문장을 쓸 때 독자도 충분히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희모 연세대교수·국문학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예측불허 콘클라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9/128/20250429520667.JPG
)
![[데스크의 눈] 대통령 집무실 이전, 최선입니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3/128/20241113500131.jpg
)
![[오늘의시선] SKT 해킹, 공포 아닌 냉정함이 필요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9/128/20250429520417.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51년 만에 돌아온 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5/128/2025041551996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