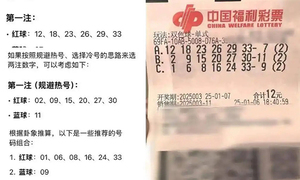텔레그램 '목사방'의 성착취 피해자 중 60%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n번방' 등 그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양상과 다른 측면이 있는 셈인데, 피해를 신고하고 긴급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인 '여성긴급전화'의 도움을 받는 남성의 비율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만을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성'으로 돼 있는 명칭이 접근을 막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여성' 문구를 빼는 식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목사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만305명 중 2877명(28%)이 남성이다. 10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이다.
남성 피해자 비중은 2022년 24.7%(1972명), 2023년 25.8%(2320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목사방 사건에서도 성착취 피해자 138명 중 84명이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 성범죄뿐만이 아니다. 여가부는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22년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의 19%, 성폭력 피해자의 9%가 남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들 중 폭력 피해 상담 창구인 여성긴급전화(1366)의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이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여가부가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신고를 받아 보호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전화 이용자 총 29만3419명 중 남성은 1만8634명으로 6.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비율이 오른 수준이다. 2022년에는 5.2%, 2023년엔 5.9%에 그쳤다.
여성긴급전화의 법적 근거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에 명시돼 있는데, 어디에도 여성만을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를 두고 피해자 지원 소통창구에 여성만이 명시돼 있어 남성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지아 의원은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여성긴급전화의 명칭을 '폭력긴급전화'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명칭 변경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 차관은 13일 회의 당시 명칭 변경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들어봤다고 했다.
여가부가 한지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해 9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1366센터를 대상으로 명칭변경 의견을 조회했다.
이를 두고 여가부 관계자는 "남성들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전화라 문제가 없지 않냐는 의견과 명칭에 제한이 있어 남성 피해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유관기관,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 수립 예정인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폭력신고상담 일원화 방안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1366 명칭 때문에 자칫 남성 피해자들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다"며 "명칭을 여성긴급전화에서 폭력긴급전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더티 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8/128/20250218518660.jpg
)
![[데스크의 눈] 訪美 민간 경제사절단에 응원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8/128/20241218500202.jpg
)
![[오늘의시선] 타이밍 놓친 추경, 더 늦춰선 안 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8/128/20250218518790.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구정아의 오도라마 시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4/128/2025020451947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