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환경분야에서 가장 비중있는 담론가로 자리 잡은 두 사람이 지난 23일 8년 전 함께 활동했던 환경운동연합의 500년 된 회화나무 앞에서 마주했다.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학자이자 운동가인 이들은 각자의 저서를 통해서도 다룬 바 있는 ‘자연·인간 공존의 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다.
 |
|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왼쪽)과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의 수령 500년 된 회화나무 앞에서 자연과 인간 공존의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최재천 원장=지구는 식물이 꽉 잡은 행성이다. 동물의 무게를 다 합쳐도 식물 무게에 비하면 저울에 올려놓을 수도 없다. 동물로 태어난 우리는 나무를 잘라내면서 마치 식물계를 지배하는 듯 착각하지만 지구상의 나무들이 보면 발가락 하나를 간질이는 수준이다. 결국엔 식물이 어떻게 될 거냐에 관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6500만년 전에 공룡을 싹쓸이했던 것과 같은 지구 대절멸사건에서 식물이 대대적으로 사라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의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등으로 식물계가 초토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식물계가 흔들리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안 소장=기후변화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다. 과연 이 상황에서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가, 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최 원장=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물의 99%가 멸종했으니까 인간이 그 1%에 속하리라는 것은 억지다. 인간도 언젠가는 멸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의 문제다. 최근에 인간이 스스로 길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훤히 보인다.
▲안 소장=인류의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류의 멸종을 결정적인 것으로 놓고 사고를 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점에서 낙관적인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 원장=하지만 억지로 긍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미래에 대한 그림은 아무리 암울하고 비관적이어도 명확히 그려야 한다. 과학이 해야 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될 듯하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다 내려놓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낫다.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성취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재밌게 찾아 할 수 있는 마음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안 소장=스칸디나비아에 상자 바깥을 보라는 속담이 있다. 소포가 왔을 때 상자 안만 들여다보면 상대방이 이걸 왜 보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위기 안에 갇혀 있다 보면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사실 이 위기는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해결할 역량도 우리에게 있다. 최근 들어 현실을 있는 대로 보되 이겨나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많은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작은 움직임에 의미를 더 부여해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최 원장=동의한다. 제인 구달 박사를 2년에 한번씩 한국에 모시고 있는데 ‘희망의 이유’라는 강의를 통해 전면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제인 구달 박사가 벌이는 ‘뿌리와 새싹’ 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미있고 작은 일부터 하다 보면 결국 된다는 것이다. 저도 희망의 싹을 가능하면 많이 틔워보려고 노력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를 만들 때 왜 ‘행동’이라는 단어를 넣었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안 소장=당시 과학자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경고하기 시작한 지 수십년이 흘렀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었다. 개인 차원에서 아무리 전기를 아끼며 노력해도 화력발전소 하나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집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를 시민과 함께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최 원장=‘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벌레 먹은 과일이 약을 안 쳐 더 건강하지만 소비자는 예쁜 과일을 원한다. 약을 전혀 안 칠 수는 없지만 절대로 흠집이 없어야 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그만큼이라도 줄여보려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다.
▲안 소장=지질학자들은 앞으로 ‘인류세(인간이 행한 환경훼손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현 인류 이후의 시대)’로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 인류세를 만든 인간들이 결국 추구해온 것이 경제성장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인간이 추구하는 경제성장과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운명 사이에 분명한 긴장관계가 있다.
▲최 원장=모든 환경문제의 저변에는 인구 문제가 있다. 그동안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구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를 포함해 살 만한 나라에서 자국민 숫자가 줄어든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3세계에서는 아직도 지구가 폭발할 수준으로 출산율이 높은데 그나마 출산율을 낮추는 데 성공한 나라들이 다시 높이면 엄청난 인구증가가 가속화할 것이고 환경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전 지구적으로 인구가 이동해야 하는 거지 인구를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
▲안 소장=어떻게 분배하느냐도 중요하다. 단 10%가 80%를 쓰고 나머지 90%가 20%를 쓴다는 주장도 있다. 분배의 왜곡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지구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최 원장=자연계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다 풀려나간다. 굉장히 잔인하게 풀린다는 게 문제다.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게 내버려두면 못 가지고 힘없는 사람이 당한다. 인간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함께 추구하는 것은 분배를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지 승자독식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분명 과격한 방법이지만 리셋을, 부팅을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
▲안 소장=요즘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대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쉽게 한다. 하지만 눈으로 인지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나 느끼느냐가 환경문제에서 중요한 것 같다. 1972년에 블루마블(푸른지구의 모습)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었다. 지구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많은 동식물들의 운명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밖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자의식이 생겼다. 지구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고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 자기인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태생적으로 지구주의자다. 가수 홍순관의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가 있는데,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이고 농부의 무게라는 얘기를 한다. 농민의 땀과 햇빛, 바람이 다 응축돼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적 인식만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통섭(다양한 영역에 있는 지식의 통합)적인 사고가 환경문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정리=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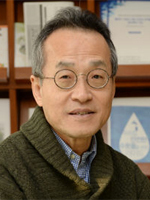
▲1954년생 ▲서울대 동물학과 ▲하버드대 생물학 박사 ▲미시간대 생물학과 조교수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2006년∼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2013년 10월∼ 국립생태원 원장

▲1963년생 ▲서울대 해양학과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 응용생태학부 박사 및 생태연구소 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2009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2014년∼ 시민 환경연구소장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트럼프發 미국 보이콧 확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9/128/20250309510225.jpg
)
![[특파원리포트] 승자의 도덕성과 책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6/128/20250216509627.jpg
)
![[이종호칼럼] 반도체 족쇄 풀고 인재 키워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2/128/20250202509481.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히틀러의 도박, 1944년 12월 아르덴 공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2/128/20250112515496.jpg
)








